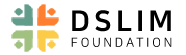빠진 구덩이가 쉬게 한다
정재현 교수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를 구해 준다.
호텔의 대리석 바닥은 우아하고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보기 좋게 매끄러우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이 비칠 정도로 매끈한 바닥은 어떨까요? 너무 매끄럽다 못해 미끄럽지요. 게다가 물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기까지 한데요. 그래서 걷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끄러지면서도, 그러는 줄도 모르고 매끄럽게만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었습니다.
스케이트장의 아이스링크는 미끄러워도 평면이라 좀 낫습니다. 그러나 스키장이라면 어떨까요?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 떨어지듯이, 사정없이 구르게 됩니다. 만일 걸릴 만한 곳이 없으면 어디까지 내동댕이쳐질지 모를 일입니다. 비탈이 덜 심한 곳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위험할 텐데요. 매끈한 곳에서는 서 있을 수 없지만 우연히 구덩이라도 있으면 멈춰 설 수 있겠지요. 한참 뒹굴었다면 오히려 거기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빠질 것 같은 구덩이가 오히려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쉬게까지 해 줄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그곳에서 정신도 차리고 매무새를 추스를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지듯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처럼 구덩이와 같은 장애물이, 호텔 바닥처럼 매끄럽지 않은 거친 땅이 오히려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친 땅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칠어서 미끄러지지 않기에 걷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얼음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쉼터가 오히려 거친 길이나 구덩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은 무조건 없애 버려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속절없이 달려가는 삶에 속도를 조절하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힘들었던 삶의 길을 고쳐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친 길이 오히려 쉼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을 뿐이지요.
갈등 없는 세상을 찾으려 했지만
그렇게 보면 갈등은 때로 우리 삶에서 머무르듯 스쳐 가는 마찰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친 길에서 쉼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등에서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언어철학자로 알려진 비트겐쉬타인은 그의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갈등 없는 언어를 찾으면 삶이 매끈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추려낸 아름다운 언어로 만들어진 세상은 너무도 매끈하여 미끄러웠다. 마찰이 없는 미끄러운 얼음판으로 잘못 들어섰던 것이다. 갈등이 없는 언어를 찾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걷고 싶다. 그러므로 마찰이 필요하다. 거친 땅으로 되돌아가자! 갈등의 삶으로 되돌아가자.”
루트비히 비트겐쉬타인, <철학적 탐구>
우리들 대부분은 비트겐쉬타인이 말한 것처럼 갈등 없는 언어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조정하고 제거하여 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실 갈등을 좋아하거나 편안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갈등을 줄이고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소한 긴장에서부터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한 우리 삶에서 갈등 조정은 필수과제이기까지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에 속지 말자
그러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조율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적당한 언어들을 찾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려진 아름다운 언어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상 적지 않습니다. 언어들로만 보자면 이미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 못해 넘치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언어로 주고받게 되면 세상은 일사천리로 매끈하게 굴러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들의 관계는 물론 이익집단 사이도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소통하면 참으로 매끈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낸 아름다운 언어는 세상을 매끈하게 하다못해 급기야 미끄럽게까지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여구들로 포장된 세상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앎의 차원에서 보면 매끄러운 세상이지만, 삶의 현실에서 매끄러운 것은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우니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진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밀려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현실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걸어야 하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삶을, 아름다운 언어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미끄러지면서도 그러는 줄도 모르고 매끄럽게만 느끼도록 도취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걸을 뿐 아니라 쉬어가기 위해서라도 거친 땅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겐쉬타인은 ‘갈등의 삶으로 되돌아가자!’고까지 말합니다. 매끈하게 만들려다가 미끄러지는 세상에서 갈등과 마찰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매끈해 보이는 세상에서 혹 우리가 미끄러졌었다면 마찰과 갈등을 그저 피하기만 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쉬어가면서 다시금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